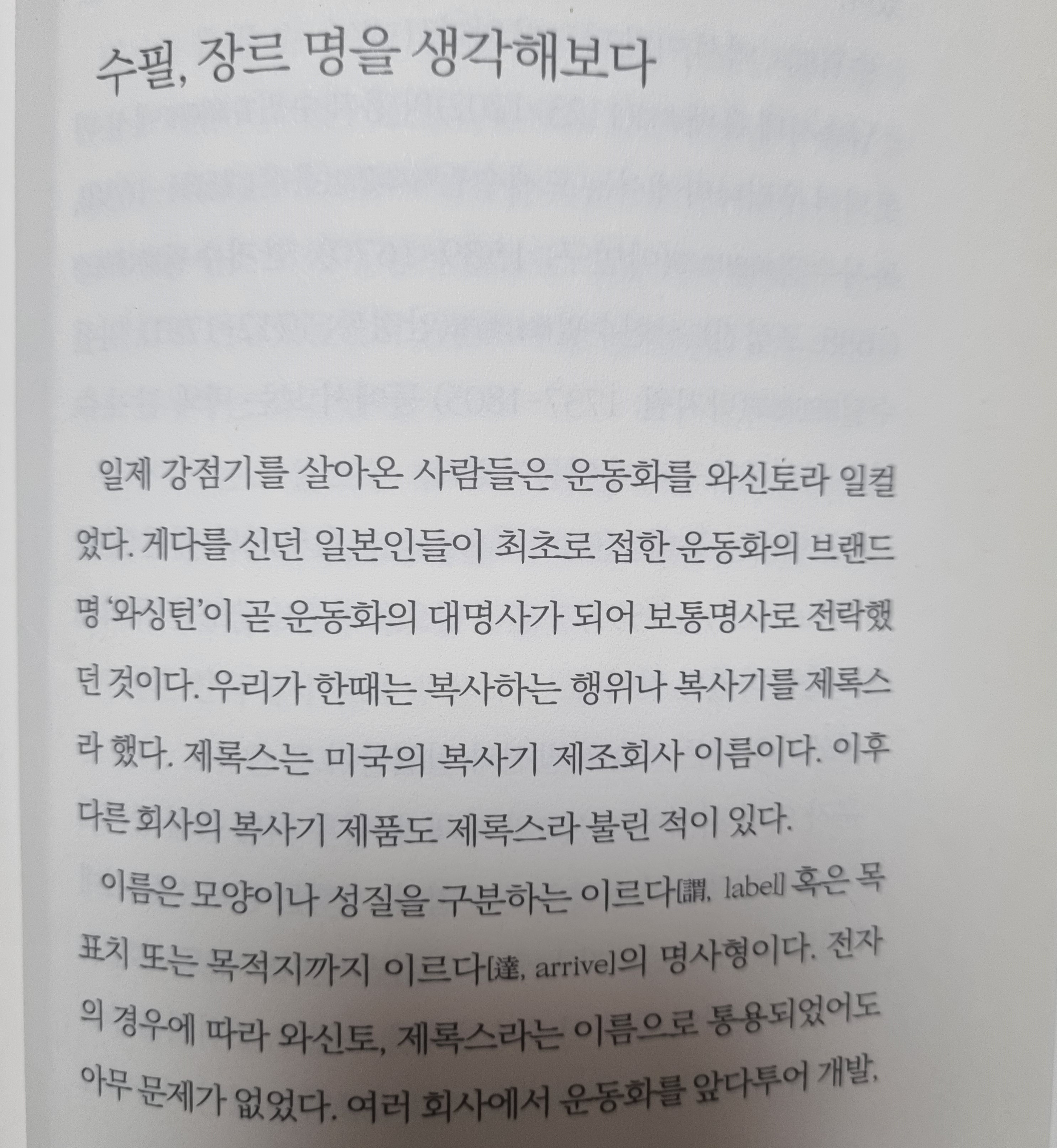
[일상& 수필레시피:장르명을 생각해 보다]
장호병 수필가의 수필집 《눈부처》에 나오는 '장르명을 생각해 보다'란 글을 1일 1 수필 산책으로 잡았다.
그의 글 '수필, 장르명을 생각하다'를 보자.
*일제 강점기를 살아온 사람들은 운동화를 와신토라 일컬었다. 게다를 신던 일본인들이 최초로 접한 운동화의 브랜드 명 '와싱턴'이 곧 운동화의 대명사가 되어 보통명사로 전락했던 것이다. 우리가 한때는 복사하는 행위나 복사기를 제록스라 했다. 제록스는 미국의 복사기 제조회사 이름이다. 이후 다른 회사의 복사기 제품도 제록스라 불린 적이 있다.
이름은 모양이라 성질을 구분하는 이르다 [謂, Label] 혹은 목표치 또는 목적지까지 이르다 [達, arrive]의 명사형이다. 전자의 경우에 따라 와신토, 제록스라는 이름으로 통용되었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 여러 회사에서 운동화를 앞다투어 개발, 유통시킴으로써 '와신토'는 새 보통명사 운동화에 자리를 양보해야 했다. 제록스 또는 인쇄복합기로 이름도 기능도 바뀌었다.
수필隨筆, 역시 이와 다르지 않다.
남송시대 홍매洪邁(1123-1202)의 용재수필容齋隨筆에서 비롯되어 우리나라에서는 도제수필陶濟隨筆(윤혼;1564-1638), 독사수필讀史隨筆(이민구;1589-1670), 한거수필閒居隨筆(1688,조성건), 상헌수필橡軒隨筆(안정복;1712-1791), 일신수필馹迅隨筆(박지원;1737-1805)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필은 저작물의 꾸러미 이름이었다.
서구에서는 몽테뉴(佛)의 < Les Essais>(1588)와 베이컨(英)의 <The Essays>(1597)가 출간됨으로써 Essay 또한 책 이름으로 출발하였던 것이다.
글쓰기 양식은 기술의 발전과 밀접하다.
문자 이전 시대에는 시詩의 시대가, 이후 시대 특히 종이제조기술과 인쇄술이 발달하고는 일기, 기행문 등의 산문 시대가 열렸다. 다만 글쓰기 능력을 인정받은 어느 정도 부가 축적된 문사들만이 활자 시대의 혜택을 누렸다. 인터넷을 주로 하는 웹 시대에는 누구나 글을 쓰고 발표하는 것이 가능하여 산문영역의 글쓰기가 확대되었다. 또 스마트폰 시대에 들어서는 한두 화면으로 소화할 수 있는 시와 산문의 융합을 앞당겼다.
필자는 한, 중, 일 수필가들의 교류를 꿈꾸고 있다. 수필가들을 소개받으려고 수필 장르에 대해 설명하는 일이 매우 궁색했다. 韓國隨筆家協會의 명함을 내놓아도 한자문화권인 그들에게는 선뜻 이해가 닿지 않았다. 그들 역시 隨筆을 '붓 가는 대로'로 연상했음인지 산문보다 한 단계 낮은 수준의 글쓰기로 인식하는 것 같았다.
중국에서는 소설 또는 우리식 수필을 쓰는 작가를 산문가라 했다. 용재수필에 대해 입을 떼니 스마트폰을 검색해 보고 그제야 알겠다면서 미소를 지었다.
수필은 한국에서 진화 발전 되고 있는, 사나 소설로는 다할 수 없는, 고유한 문학 양식이다. 국내에서조차도 '붓 가는 대로'가 아님을 굳이 변명해야 하니 피곤한 일이다.
소논문이나 비평문, 칼럼까지 포괄하는 에세이가 문학과 비문학의 영역에 걸쳐 있으면 주지의 사실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많은 수필가들이 칼럼이나 비평, 소논문 등을 문예물로 보려 하지는 않는다. 또 수필의 창작형태가 미셀러니나 인포멀 에세이에 가깝지만 자신의 작품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말하면 얼굴 표정이 밝지 않다. 산문보다는 수필이란 말을 더 선호한다. 그만큼 수필에 대한 애정이 남다름을 알 수 있다.
발을 다쳤을 때, 가볍고 제작하기에 편리한 알루미늄 의료 보조용구를 사용한다. 이게 아직 목발로 불리고 있다.
순혈주의 분위기에서도 학자가, 시인이, 소설가가 전공영역을 달리하여 일탈을 꿈꿨던 소통 꾸러미가 수필이요, 에세이였다. 신선했다.
이제 전업수필가가 생겨나고, 수필의 뼈를 묻으려는 작가들이 줄을 잇는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여기餘技나 2군을 자처하는 뉘앙스의 수필이 목발로 불리는 알루미늄 의료보조용구의 경우와 무엇이 다르냐.*<장호병:수필, 장르명을 생각해 보다/전문 >
수필이 아직도 '붓 가는 대로'로 불리는 것에 대한 통, 공시적 고찰의 현실적 상황을 짚어 본 글이다.
그의 수필집, 《눈부처》란 표제는 이 수필집 전체를 포괄하는 상징적 용어다. 《눈부처》는 그의 수필 <만남은 맛남>에서 구체적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수필집, 《눈부처》 머리말을 보자.
*정성 들여 거울을 닦는다.
좀체 지워지지 않는 얼룩
입김을 불어넣으니
너는
눈부처로 응답하는구나.
나를 존재케 하는
너!
나도 너에게
눈부처로 살고 싶다.*(경자년 가을에, 장호병)
그리고 수필, 《만남은 맛남》 의 결미 부분을 보자.
*누구를 만나든 '너'라는 거울 속에서 '나'를 만난다. 내가 정성을 들일 때 교감하는 너가 나에게 진아인 눈부처를 보여줄 것이다.
나 또한 너의 눈부처를 보여주려 눈과 귀를 활짝 연다. 너와 마주하는 나는 둘이 아니다. 나 속의 '나'까지 함께 하는 3자 회동이란 사실을 잊지 않는다.
나가 너에게,
너가 나에게
눈부처가 되는 그런 '만남은 맛남'으로 이어지리라.
'나'가 그림자처럼 함께 이불을 털고 있다. 더없이 눈부신 아침이다.*(만남은 맛남 결미 발췌)
진실이 통할 때, 아니 진정으로 너와 나, 그리고 나 속의 나인 진아와 소통할 때 '만남은 맛남'이어진다는 것이다.
수필은 의미 없는 자아가 의미 있는 자아로 거듭나는 자아회귀적 속성을 지닌다. 이는 곧 진정한 자아로서 '진아'로 거듭난 것과 같은 말이다. 거울 속의 또 다른 자신의 모습, 그 '진아'와의 소통, 화자는 '살아간다는 것은 만남의 영속이다. 눈을 뜨면서부터 감을 때까지 수많은 만남은 이어지지만 , 정작 잊고 있는 것은 바로 '나' 자신과의 만남이다. 눈을 두 개나 가지고 있어도 나는 나 자신을 볼 수가 없다. 나 속의 또 다른 '나'를 포함한 타자를 통해서만이 진정한 나의 모습과 마주할 수 있다.라고 눈부처는 말하고 있다.
'진정한 자아회귀로의 수필', 그 정수를 나는 수필집 '눈부처'를 통해 맛본다.
작가 장호병은 이 수필집으로 2023년 제8회 김규련수필문학상을 수상했다. 그는 한국문인협회 부이사장으로 그가 꿈꾼 한, 중, 일 수필가들의 교류를 실천하기 위해 일본 등지에서 해외수필 세미나를 몇 차례 개최한 바 있다.
참고로 김규련문학상은 《거룩한 본능》을 대표작으로 자연주의, 생명주의 수필을 지향한 김규련 수필가를 추모하고, 그 문학정신을 계승하고자 2016년에 한국수필문학관에서 제정한 수필 문학상임을 밝혀둔다.(2024.9.22.)
'[일상 따라 글 따라]: 일상 & 수필 레시피'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일상&수필 레시피: 동주 생각] (86) | 2024.11.27 |
|---|---|
| [일상&수필 레시피: 몰입의 즐거움] (96) | 2024.11.27 |
| [일상&수필 레시피: 열무김치에 감자를 넣는다고요?] (31) | 2024.09.03 |
| [일상& 수필 레시피: 감룽지, 아이고 내 팔자야~~] (98) | 2024.08.20 |
| [일상& 수필 레시피: 수필, 제미나이에게 묻다] (115) | 2024.08.12 |